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 인기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완성도 높은 영상미와 각본으로 항상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전 작품 인테스텔라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시간과 관련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테넷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넷의 작품을 감상한 관객들은 유독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테넷의 스토리라인이 시간여행을 다루고 있고, 시간이 뒤죽박죽 얽히기 때문이긴 한데 어떤 이들은 어려운 과학적 이론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작품 '테넷'의 주요 키워드는 두가지 입니다.
바로 '엔트로피' 와 '인버전'

영화의 핵심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 통에 영화 테넷을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는 사실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현혹되었을 뿐이죠.

엔트로피를 이해하려하지말고 그냥 '엔트로피라는게 있구나' 정도로 그냥 지나가도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궁금하기에 한번 알아봅시다.
엔트로피 Entropy
엔트로피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열의 이동과 더불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정도나 무효에너지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양
2. 정보를 내보내는 근원의 불확실도를 나타내는 냥
3. 정보량의 기대치를 이르는 말.
영화에서 사용된 엔트로피의 의미는 1번입니다. 엔트로피란 물질의 열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중 하나죠.

계(system)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상태함수인데, 열학적 계에서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기술할 때 사용됩니다. 흔히들 '무질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어렵지만 그냥 '무질서'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요.
엔트로피는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를 그래도 깊게 이해하시려면 열역학 제1법칙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열과 역학 에너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을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무언가'였고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에 힘을 작용했을 때 생기는 에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45년, 제임스 줄이 물통 속에 넣은 바퀴를 추의 낙하로 회전시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줄에 의해 열과 역학에너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1cal = 4.2J , 1칼로리는 4.2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47년, 마침내 열역학제1법칙이 탄생하게 됩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가 줄의 연구에서 열과 역학에너지를 통합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 어떤 계의 에너지변화는 공급된 열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합과 같다. 즉, 열과 일은 똑같은 에너지이며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실험이 벌어집니다.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열원을 사용하여 동력을 만들고, 다시 그 동력을 이용해 열을 만들면 무한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해보였죠.

하지만 프랑스의 물리학자 니콜라 레오나르 사디 카르노는 증기기관 연구를 통해 이는 불가능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일부의 에너지가 동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일(동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될지언정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영화 테넷의 배경설정에도 깔려 있습니다. '고갈되는 자원과 말라가는 강...' 멸망앞에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르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에너지의 전환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만 한다는 사실들을 종합해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가 1865년에 마침내 열역학 제2법칙을 발표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 :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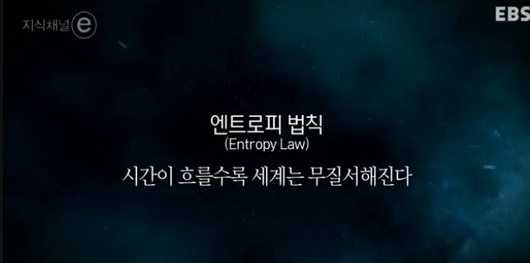
클라우지우스는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물리학계에 받아들여 졌고 열역학 제2법칙이 되었죠. 그러므로 고립된 우리 자연계, 즉 우리세계는 엔트로피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세계입니다.

자연계는 항상 에너지의 차이를 맞추어 평형이 되려고 합니다. 전자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공기의 흐름, 물의 움직임 등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엔트로피 증가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엔트로피는 무질서 혹은 무용에너지를 뜻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누군가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를 감소하는 상태로 만드는 어떤 장치를 만든다면?
흥미로운 가정이죠. 바로 영화 테넷의 핵심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연계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닙니다.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압도, 물도, 전류도 모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자꾸만 증가합니다. 이걸 억지로 막으려하면 할 수록 엔트로피는 더더욱 증가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릅니다.

'뜨거운 커피가 시간이 지날수록 식는다.'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반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오면서 커피를 식게 만들며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장치가 만들어지면 시간은 반대로 흐를 것입니다.
영화 '테넷'에서는 이를 <<인버전>>이라고 했습니다. 벽에 박혀 있던 총알이 다시 되돌아가서 총구로 향하는 시간역행.

인버젼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열역학제2법칙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